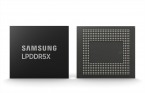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영국 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브렉시트 찬반론이 거론되어 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렉시트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원로인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 잘못 인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제2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영국의 EU 탈출은 가능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되돌릴 국민투표가 또 다시 실시될 수 있을지, 영국의 브렉시트를 두고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알려진 반응은 잠시 뒤로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지역별 여론을 살펴본다.
▍
런던과 지방 핵심 도시의 격차가 브렉시트 찬반론으로 이어져
런던은 대영 제국의 영광을 짊어진 금융 도시로, 유럽 대륙 측의 파리와 프랑크푸르트의 금융을 모두 합쳐도 런던에 견줄 수 없다. 지금껏 런던은 'EU권의 금융 센터'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와 자금을 모아 왔기 때문이다. 런던은 EU의 장점을 마음껏 받아 온 지역으로 국민 투표에서도 잔류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 런던이 번성하다고 해서 영국 전체가 안정된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전통을 가진 공업 도시 맨체스터와 버밍엄은 1980~1990년대 번영하는 런던을 본체만체하고 쇠퇴와 몰락의 쓰라림을 겪었다. 중후한 벽돌 구조의 상업용 건물이 도심부에서조차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당시의 지역 경제가 상당히 아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맨체스터와 버밍엄이 새로운 유형의 산업도시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 들어서부터다. 지금은 '런던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인수 태세'와 '영국 북부 및 중부의 핵심 금융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맨체스터와 버밍엄은 "EU의 장점이나 요행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인이 이러한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EU 이탈파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어 북방 스코틀랜드 땅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엿볼 수 있다. 영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연합왕국)'. 이른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4왕국의 연합에 의해 성립됐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1707년까지 독립된 왕국을 유지했던 역사와 함께, 수도 런던이 영국 전체를 주무르는 잉글랜드에 대한 저항 의식이 강하다.
또한 북해 유전에서 막대한 부가 축적되면서 "잉글랜드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로 인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론'마저 거론되어 온 지역이기도 하다. 당연히 브렉시트에 있어서도 "잉글랜드가 이탈한다면, 이를 틈타 우리는 잉글랜드에서 떨어져 더 큰 EU의 틀에 남아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잔류파가 다수를 차지한다.
▍
탈 EU후 영국 경제의 생명선은?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영국 내에서는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경제 상황, 대 EU 관이 있다. 다만, 그들에게 공통된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EU가 없어도 영국으로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 세계에 걸친 영어 경제권"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체감 경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 런던의 금융가나 일부 고급 주택지를 제외하면 불경기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은 유럽 대륙의 주요 국가보다 높고, 실업률도 낮다. "지금 유럽 대륙에서 우리처럼 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 정도다"라고 영국인은 자신감을 내비친다. 영국인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대서양의 건너편에는 그들과 똑같은 영어권 초강대국 미국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남동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인구 12억명이 넘는 옛 영연방 인도가 있다. "2040년이 되면 인도의 GDP가 미국을 초과할 것"이라는 설도 점점 유력해지고 있으며, 인도의 비즈니스 지배층은 영어를 말하는 미국보다 영국에 문화적인 친근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 EU 후 영국 경제의 생명선은 인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영국이 외로움을 타기 전에는 결코 EU 이탈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뉴욕채권] 美 국채 수익률 큰 폭 하락...2년물 5% 내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18084901089253bc914ac71122322151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