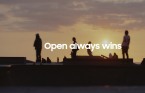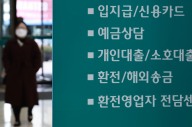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리딩뱅크 탈환'을 재차 주문했고, 민영화 숙원을 이룬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도 이제는 1등 금융그룹이 목표라고 했다. 덩치가 비슷한 4개 은행이 맞붙다 보니 1위 싸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반복되는 '정중지와(井中之蛙)'의 씁쓸함은 여전하다.
윤 회장의 유난스런(?) 리딩뱅크 집착은 과거의 영광에 기인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는 2004년 국민카드 합병 관련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돼 국민은행을 떠났었는데, 해당 사건은 KB금융의 '잃어버린 10년'의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시 김정태 전 행장의 석연찮은 퇴진 이후 후임 강정원 전 행장을 비롯해, 황영기, 어윤대, 임영록 전 회장 모두 외부 출신이 수장 자리를 꿰찼고, 급기야 'KB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잘 나가던' 리딩뱅크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관치(官治)가 꼽혔다. 하지만 내부 비효율을 초래한 진짜 원흉은 따로 있다. 리딩뱅크 시절 국민은행은 경쟁사보다 더 많이 뽑았고 더 크게 늘렸다. 비대해진 덩치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고, 급기야 30~40대 핵심인력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말았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리딩뱅크 집착이 빚어낸 아이러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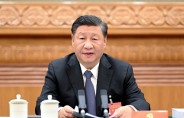











![[모바일 랭킹] 작혼, '블루 아카이브' 컬래버 후 매출 119위→11...](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2016003305766c5fa75ef8612254575.jpg)



![[뉴욕증시] 엔비디아 10% 폭락에 나스닥지수 2% 급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2006032600384c35228d2f5175193150103.jpg)